팽창 중인 AI데이터센터 분야, ‘K-산업’이 알아야 할 것
데이터센터 산업을 위협하는 전력 수급, 공급망, 보안, 인력 등 7대 리스크에 대응하지 못하면 AI 혁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EPC와 에너지 솔루션, 자원 순환을 결합한 SK에코플랜트의 기술력이 이러한 제약을 어떻게 기회로 전환할지 짚어본다.


전승민
과학기술분야 전문 기자 및 저술가
.
고성능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필수성과 과제
고성능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이다. 대형 데이터센터는 규모가 얼마나 될까.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로 꼽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부지 면적만 8만9000평으로 축구장 41개 크기에 달한다. 전체 사업비 중 네이버가 투자한 금액만 6500억 원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최근 건설되는 데이터센터의 투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메타(Meta)가 짓고 있는 첨단 AI 데이터센터는 구축 비용이 약 8억 달러(한화 약 1조1450억 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도 규모를 충분히 크다고 하기 어렵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미시시피주에 2개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인데, 총 투자액이 100억 달러(약 14조3000억 원)에 달한다. 데이터센터 하나에만 7조15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셈이다. 국내에서도 SK그룹이 AWS와 함께 울산에 7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큰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아마도 챗GPT(ChatGPT) 개발사 ‘오픈AI(OpenAI)’와 ‘소프트뱅크(Softbank)’, ‘오라클(Oracle)’ 등이 공동으로 기획 중인 ‘더 스타게이트(The Stargate)’ 프로젝트일 것이다. 이 사업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엔비디아(NVIDA) 등도 참여하는데, 투자 규모가 1000억 달러(약 143조 원)에 달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후 최대 5000억 달러까지 투자를 늘릴 계획으로, 미국 전역에 약 20개의 AI 데이터센터를 세운다는 목표인데, 어림 계산으로도 데이터센터 하나당 250억 달러(약 30조 원) 이상이다.
관건은 이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질 정도로 AI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AI의 성능은 규모와 비례해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확보는 필수적 선택이 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어지며 시장도 고속 성장 중이다. 시장조사기업 마켓앤마켓스(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1677억6000만 달러(약 241조 원)였으나 2030년에는 9337억6000만 달러(약 1340조 원)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대한민국 2025년 국가 예산(673.3조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연평균 성장률 31.6%라는 수치는 그만큼 매우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진 산업임을 보여준다.
.
데이터센터 성공의 제1조건: 전력 확보
문제는 그만큼 대량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AI 연산을 담당하는 핵심 장비는 GPU(Graphic Processing Unit, 그래픽처리장치)다. AI 데이터센터란 결국 이 GPU 수십만 개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시설이다. 실제로 미국 AI 기업 엑스AI(xAI)는 ‘콜로서스(Colossus)’라는 이름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했는데, 현재 GPU 20만 개 규모이며 최종 목표는 100만 개다.

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라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2024년 460TWh(테라와트시)에서 2035년 1,300TWh로 세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총 전력 발전량(2024년 기준 595TWh)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골드만삭스 리서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전 세계 전력의 14%를 차지하며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30년에는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160~1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미국은 전력 부담이 더 크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의 2024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183TWh였으나, 2030년에는 426TWh로 133%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센터는 결국 전력을 필요로 한다.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 AI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
데이터센터 운영을 가로막는 7가지 걸림돌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살펴보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이 바로 전력 피크 문제다. 전력은 언제나 공급량이 사용량보다 많아야 한다. 일순간이라도 사용량이 더 많아지면 전력망이 멈추는 ‘블랙아웃’이 발생한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365일 대량의 전기를 지속적으로 소모해 사회 전체 전력 사용량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각국은 기상상황에 따라 전력 발전량의 간헐성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공급 시 전력 발전의 운영·예측 전문성에 대한 요소도 중요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공급망 문제다. 전력 수요가 커진 만큼 송전 인프라도 함께 확충되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공급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을 연결하는 데 필수적인 변압기, 개폐장치 등 설비조차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을 늘리려 해도, 패널은 물론 철강·알루미늄·구리·목재 등의 공급이 부족하면 답이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적 공급망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세 번째는 발전시설 구축 시간과의 불일치다. 데이터센터는 1~2년이면 완공할 수 있지만,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발전 용량을 확충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예컨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가스터빈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면 공사와 승인 과정이 상대적으로 훨씬 길고, 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송전선 설치는 수년 이상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네 번째로는 보안 문제를 들 수 있다.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은 물론이고 테러 같은 물리적 위협도 상존한다.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에서 보듯 데이터센터 사고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데이터센터 자체의 보안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을 노리는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행정 절차 문제다.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전력망 확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만 2년 넘게 걸린다. 한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에 필요한 행정 허가 기간이 통상 1~3년 수준이며, 인허가에 약 1년,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계통 영향 평가’에 다시 6개월~1년 이상이 필요하다.
여섯째는 인력 문제다. 데이터센터 운영은 고도의 전문 영역인데, 설립 수요 급증과 맞물리며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데이터센터에 적합한 전력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도 충분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스 등 기타 인프라 공급 문제가 있다. 많은 데이터센터가 가스터빈 발전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가스 파이프라인 용량 부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미국 남동부에서는 데이터센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40년까지 2만MW 이상의 신규 가스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하루 33억 입방피트(약 934억 L)가 넘는 파이프라인 용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또한 전기뿐 아니라 냉각 과정에 필요한 물 공급 역시 핵심 요소다. 전력만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
위기를 기회로: AI 데이터센터 산업 ‘다크호스’ 노릴 때
이처럼 AI 데이터센터 산업에는 여러 제약 요소가 존재하지만, 반대로 이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된다. 설계·조달·시공(EPC), 에너지 솔루션, 자원 순환 등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이라면 7대 과제에 대한 종합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K에코플랜트의 경우, 총 7조원이 투입되는 ‘울산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인프라 구축을 전담할 만큼 안정적인 통합 솔루션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연료전지 솔루션,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 경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어할 수 있는 폐열회수 냉각 기술과 전력·용수 설계 및 관리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 공정까지 설계, 운영한 노하우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단계에 필요한 반도체 클린룸 수준의 청정도 관리, 초정밀 전력 제어, 고효율 열관리 등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고밀도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설계 단계부터 효율성과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환경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기업은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종합선물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격이어서 급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분야 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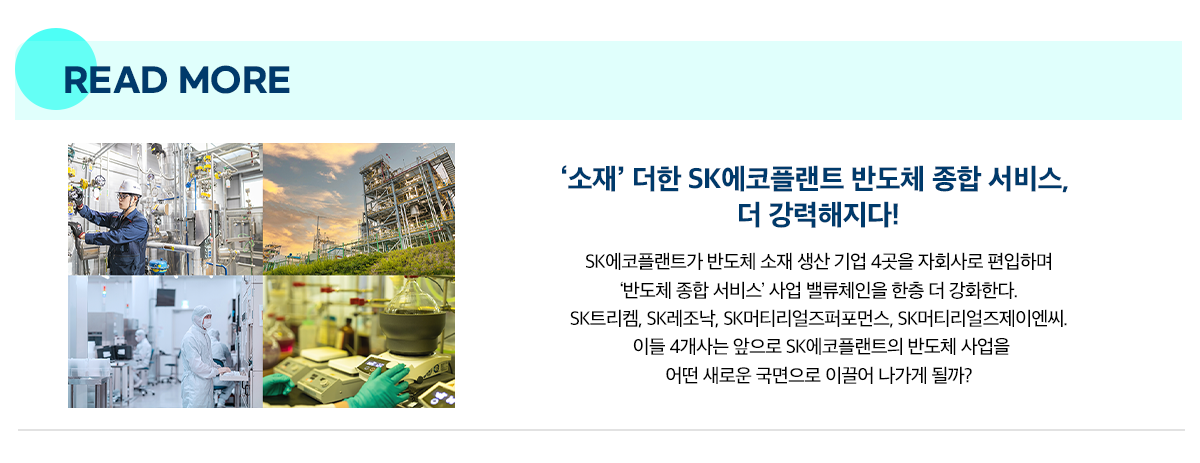

AI 시대에 데이터센터는 불가분의 존재이다. 이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사회적 노력 역시 중요하다. 연료전지와 같은 고효율 분산 전원을 도입하는 데이터센터에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의 앞선 역량에 더해 이런 사회적 노력이 합쳐진다면, AI 시대에 적합한 우리나라만의 기술 경쟁력 역시 안정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
전승민 기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과학 저널리즘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동아일보 과학팀장, 과학동아 기자, 동아사이언스 수석기자를 역임했다.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대중서를 15권 이상 발간했다. 현재는 과학기술분야 전문 저술가로서 다수의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연관 콘텐츠
팽창 중인 AI데이터센터 분야, ‘K-산업’이 알아야 할 것


전승민
과학기술분야 전문 기자 및 저술가
.
고성능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필수성과 과제
고성능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이다. 대형 데이터센터는 규모가 얼마나 될까.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로 꼽히는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은 부지 면적만 8만9000평으로 축구장 41개 크기에 달한다. 전체 사업비 중 네이버가 투자한 금액만 6500억 원 이상 소요됐다.

하지만 최근 건설되는 데이터센터의 투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메타(Meta)가 짓고 있는 첨단 AI 데이터센터는 구축 비용이 약 8억 달러(한화 약 1조1450억 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도 규모를 충분히 크다고 하기 어렵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미시시피주에 2개의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인데, 총 투자액이 100억 달러(약 14조3000억 원)에 달한다. 데이터센터 하나에만 7조15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셈이다. 국내에서도 SK그룹이 AWS와 함께 울산에 7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큰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은 아마도 챗GPT(ChatGPT) 개발사 ‘오픈AI(OpenAI)’와 ‘소프트뱅크(Softbank)’, ‘오라클(Oracle)’ 등이 공동으로 기획 중인 ‘더 스타게이트(The Stargate)’ 프로젝트일 것이다. 이 사업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엔비디아(NVIDA) 등도 참여하는데, 투자 규모가 1000억 달러(약 143조 원)에 달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향후 최대 5000억 달러까지 투자를 늘릴 계획으로, 미국 전역에 약 20개의 AI 데이터센터를 세운다는 목표인데, 어림 계산으로도 데이터센터 하나당 250억 달러(약 30조 원) 이상이다.
관건은 이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질 정도로 AI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AI의 성능은 규모와 비례해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확보는 필수적 선택이 되고 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 투자가 이어지며 시장도 고속 성장 중이다. 시장조사기업 마켓앤마켓스(MarketsandMarkets)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1677억6000만 달러(약 241조 원)였으나 2030년에는 9337억6000만 달러(약 1340조 원) 수준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대한민국 2025년 국가 예산(673.3조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연평균 성장률 31.6%라는 수치는 그만큼 매우 강력한 성장 동력을 가진 산업임을 보여준다.
.
데이터센터 성공의 제1조건: 전력 확보
문제는 그만큼 대량의 전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AI 연산을 담당하는 핵심 장비는 GPU(Graphic Processing Unit, 그래픽처리장치)다. AI 데이터센터란 결국 이 GPU 수십만 개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시설이다. 실제로 미국 AI 기업 엑스AI(xAI)는 ‘콜로서스(Colossus)’라는 이름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했는데, 현재 GPU 20만 개 규모이며 최종 목표는 100만 개다.

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라 전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2024년 460TWh(테라와트시)에서 2035년 1,300TWh로 세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대한민국의 총 전력 발전량(2024년 기준 595TWh)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골드만삭스 리서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전 세계 전력의 14%를 차지하며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30년에는 AI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160~1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미국은 전력 부담이 더 크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미국의 2024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183TWh였으나, 2030년에는 426TWh로 133%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데이터센터는 결국 전력을 필요로 한다. 안정적 전력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이 AI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
데이터센터 운영을 가로막는 7가지 걸림돌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살펴보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이 바로 전력 피크 문제다. 전력은 언제나 공급량이 사용량보다 많아야 한다. 일순간이라도 사용량이 더 많아지면 전력망이 멈추는 ‘블랙아웃’이 발생한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365일 대량의 전기를 지속적으로 소모해 사회 전체 전력 사용량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각국은 기상상황에 따라 전력 발전량의 간헐성을 가지고 있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재생에너지 공급 시 전력 발전의 운영·예측 전문성에 대한 요소도 중요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공급망 문제다. 전력 수요가 커진 만큼 송전 인프라도 함께 확충되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공급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을 연결하는 데 필수적인 변압기, 개폐장치 등 설비조차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광 발전을 늘리려 해도, 패널은 물론 철강·알루미늄·구리·목재 등의 공급이 부족하면 답이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제적 공급망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세 번째는 발전시설 구축 시간과의 불일치다. 데이터센터는 1~2년이면 완공할 수 있지만,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발전 용량을 확충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예컨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가스터빈 발전소를 새로 짓는다면 공사와 승인 과정이 상대적으로 훨씬 길고, 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송전선 설치는 수년 이상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네 번째로는 보안 문제를 들 수 있다.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은 물론이고 테러 같은 물리적 위협도 상존한다.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에서 보듯 데이터센터 사고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데이터센터 자체의 보안뿐 아니라,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을 노리는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행정 절차 문제다.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전력망 확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미국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만 2년 넘게 걸린다. 한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에 필요한 행정 허가 기간이 통상 1~3년 수준이며, 인허가에 약 1년,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 계통 영향 평가’에 다시 6개월~1년 이상이 필요하다.
여섯째는 인력 문제다. 데이터센터 운영은 고도의 전문 영역인데, 설립 수요 급증과 맞물리며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데이터센터에 적합한 전력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도 충분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스 등 기타 인프라 공급 문제가 있다. 많은 데이터센터가 가스터빈 발전을 통해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가스 파이프라인 용량 부족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미국 남동부에서는 데이터센터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40년까지 2만MW 이상의 신규 가스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하루 33억 입방피트(약 934억 L)가 넘는 파이프라인 용량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된다. 또한 전기뿐 아니라 냉각 과정에 필요한 물 공급 역시 핵심 요소다. 전력만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
위기를 기회로: AI 데이터센터 산업 ‘다크호스’ 노릴 때
이처럼 AI 데이터센터 산업에는 여러 제약 요소가 존재하지만, 반대로 이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업에게는 큰 기회가 된다. 설계·조달·시공(EPC), 에너지 솔루션, 자원 순환 등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이라면 7대 과제에 대한 종합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SK에코플랜트의 경우, 총 7조원이 투입되는 ‘울산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인프라 구축을 전담할 만큼 안정적인 통합 솔루션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연료전지 솔루션, 다양한 재생에너지 활용 경험,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어할 수 있는 폐열회수 냉각 기술과 전력·용수 설계 및 관리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 공정까지 설계, 운영한 노하우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단계에 필요한 반도체 클린룸 수준의 청정도 관리, 초정밀 전력 제어, 고효율 열관리 등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고밀도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설계 단계부터 효율성과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환경을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기업은 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종합선물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격이어서 급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분야 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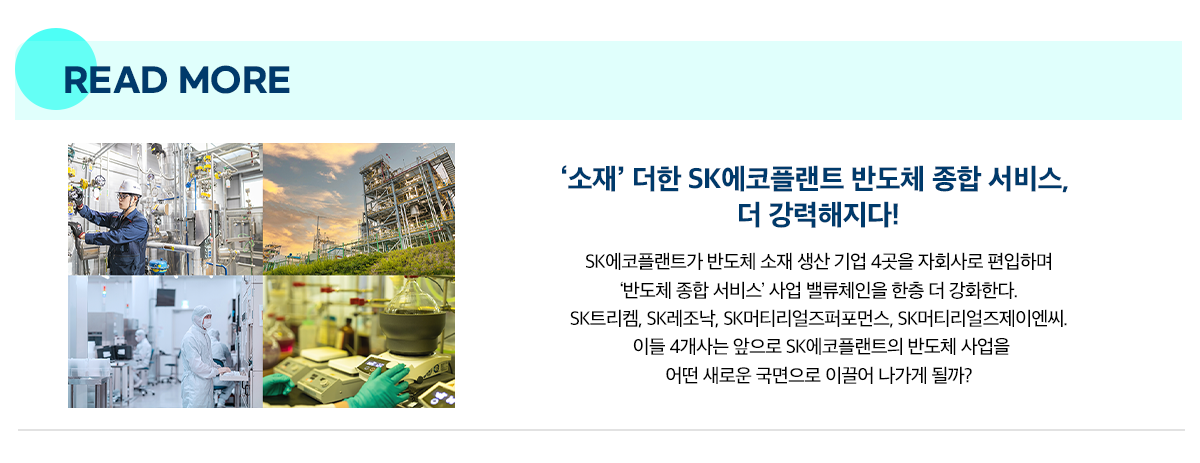

AI 시대에 데이터센터는 불가분의 존재이다. 이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사회적 노력 역시 중요하다. 연료전지와 같은 고효율 분산 전원을 도입하는 데이터센터에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의 앞선 역량에 더해 이런 사회적 노력이 합쳐진다면, AI 시대에 적합한 우리나라만의 기술 경쟁력 역시 안정적으로 뻗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
전승민 기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과학 저널리즘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동아일보 과학팀장, 과학동아 기자, 동아사이언스 수석기자를 역임했다. 인공지능, 로봇,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 대중서를 15권 이상 발간했다. 현재는 과학기술분야 전문 저술가로서 다수의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