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물의 날 특집]AI 시대 반도체는 ‘물’을 먹고 자란다
AI 시대가 도래하며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많은 양의 물이 쓰인다는 건 잘 알려져 있다. 재료를 가공하는 고압수, 회로 세척 과정에서 쓰이는 초순수, 모두 물을 이용한다. 최근에는 사용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공정에 다시 투입하는 ‘반도체 수처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3월 22일 물의 날을 맞아, 반도체 수처리 산업과 주요 기술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전승민
과학기술분야 전문 저술가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기틀이다. 최근엔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다. 자동차도, 가전제품도, 심지어 현관문의 출입 시스템마저도 모두 반도체가 탑재된다. 더구나 세상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반도체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즉 현시대에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반도체의 기본 재료인 실리콘, 비소갈륨 등의 광물 및 불화수소 가스를 확보해야 하고, 고정밀 반도체 생산장비도 수급해야 한다. 그러나 반도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다른 무엇보다 먼저 확보해야 할 기본 조건으로 꼽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이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양의 물을 사용하기에 존재할 수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공장 한 곳에서만 하루에 수만 톤 이상의 물을 소모한다. 고압의 물을 이용해 재료를 가공하고, 고순도의 물로 회로를 세척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며, 물은 반도체 산업의 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물을 무한정 쓸 수 없다는 점이다. ‘2024년 유엔 세계 물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해 막대한 양의 용수를 끌어 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사용한 물을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 다시 사용하면 된다.
.
반도체 산업에 ‘물’이 필요한 이유
먼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물이 왜 필요한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반도체는 기본 재료를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한 뒤 그 위에 전기회로를 그리고,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금속 단자 등을 연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반도체 생산 과정은 불순물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전기 흐름에 영향을 미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높은 순도의 ‘초순수(UPW, Ultra Pure Water)’가 쓰인다. 초순수는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와 산소 이외에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은 물로, 일반적인 물속의 이온(Ion), 미립자(Particle), 염소(Chlorine), 이산화규소(Silica) 등이 제거된 고도로 정제된 물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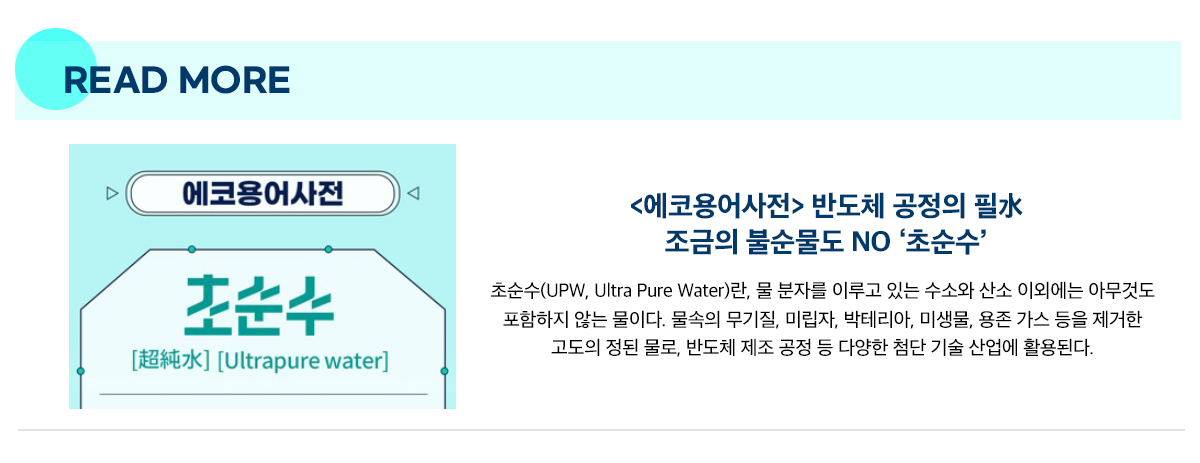
이러한 초순수를 고압으로 쏘아 실리콘 덩어리를 잘라내어 원판 모양의 ‘웨이퍼’로 만들고, 그 위에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약품을 초순수로 세척하는 식이다.
때문에 이런 초순수는 다양한 산업에서 두루 이용되지만, 반도체 산업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전체 공업용수 중에서도 초순수의 비율은 약 50% 정도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양의 물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각종 화학물질로 오염된다는 데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폐수를 처리하는 것, 이른바 ‘반도체 수처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주목받는 ‘반도체 수처리’ 산업
반도체 수처리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폐수 정화 기술’이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에는 총유기탄소(TOC, Total Organic Carbon, 수중 유기물 구성 탄소의 총량),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 강염기성 유기화학물질), 이산화규소(SiO₂), 요소(Urea) 등 주요 오염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런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맞춤형 기술이 필요하므로, 철저한 연구와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현대 화학 기술을 동원하면 각각의 성분에 맞는 정화법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TMAH는 고도산화공정(AOP, Advanced Oxidation Process)을 거치면 폼알데하이드(HCOH)와 암모니아(NH₃)로 분해된다. 두 가지 물질 모두 산업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중요 자원이다. 요소는 가정용 고성능 정수기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역삼투막법(RO, Reverse Osmosis)을 이용해 50% 정도 제거가 가능하다. 50%면 정화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필요한 수준까지 정화할 수 있다.
물의 순환만 생각하면 모든 폐수를 다시금 초순수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나 효율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초순수까진 아니어도 환경 기준에 맞는 맑은 물로 만들어 배출하거나, 적절한 수준의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수처리 전문기업들의 활약이 필요해진다. 이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이 원하는 초순수를 생산해 납품하고, 공장 내에 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필요하면 폐수를 수거해 처리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Verif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반도체 수처리 시장 규모는 2023년에 5,246억 달러(약 760조원)에서, 2031년에는 7,902억 달러(약 1,150조원) 규모로 확대되며 연평균 6.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처리 분야 국내 기업 활약도 기대
국내에서도 사용된 물을 더 효율적으로 재이용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물 재이용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하루 12만 톤(t)의 재활용 용수를 반도체 사업장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 분야 기업들도 물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하·폐수 재활용 기술 중 하나인 CSRO(Circle-Sequence Reverse Osmosis, 순차적 순환공정역삼투막)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기술은 오염수를 정방향, 역방향으로 순차적 전환하는 기술로, 한 번의 공정으로 폐수가 삼투막 필터를 여러 차례 왕복하도록 해 수질 정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일반적인 역삼투막 공정의 하·폐수 재이용 회수율은 보통 75% 수준으로 설계되는데, SK에코플랜트는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CSRO 기술 파일럿 실증을 진행한 결과 최대 회수율 97%를 달성했다. 이러한 기술의 우수성과 자원절약 효율성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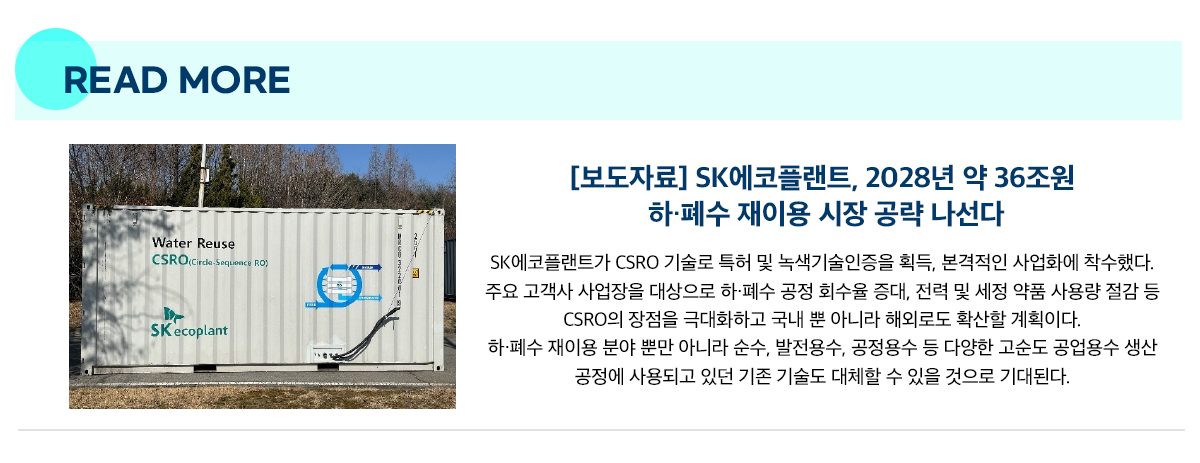
앞으로 물 부족 문제는 점차 심화할 것으로 여겨진다. 2020년 발표한 환경부의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 국내 하루 공업용수 부족분은 하루 약 133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I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지금, 반도체 수처리 기술 확보는 이미 국가적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다.
전승민 기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과학 저널리즘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동아일보 과학팀장, 과학동아 기자, 동아사이언스 수석기자를 역임했다. 현재 과학 및 기술, 의학 분야 저술가로서 다수의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연관 콘텐츠
[세계 물의 날 특집]AI 시대 반도체는 ‘물’을 먹고 자란다


전승민
과학기술분야 전문 저술가
반도체는 현대 문명의 기틀이다. 최근엔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다. 자동차도, 가전제품도, 심지어 현관문의 출입 시스템마저도 모두 반도체가 탑재된다. 더구나 세상이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반도체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즉 현시대에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선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다. 반도체의 기본 재료인 실리콘, 비소갈륨 등의 광물 및 불화수소 가스를 확보해야 하고, 고정밀 반도체 생산장비도 수급해야 한다. 그러나 반도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다른 무엇보다 먼저 확보해야 할 기본 조건으로 꼽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이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양의 물을 사용하기에 존재할 수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공장 한 곳에서만 하루에 수만 톤 이상의 물을 소모한다. 고압의 물을 이용해 재료를 가공하고, 고순도의 물로 회로를 세척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며, 물은 반도체 산업의 쌀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물을 무한정 쓸 수 없다는 점이다. ‘2024년 유엔 세계 물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이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해 막대한 양의 용수를 끌어 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사용한 물을 깨끗한 상태로 되돌려 다시 사용하면 된다.
.
반도체 산업에 ‘물’이 필요한 이유
먼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물이 왜 필요한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반도체는 기본 재료를 원하는 모양으로 가공한 뒤 그 위에 전기회로를 그리고,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금속 단자 등을 연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런 반도체 생산 과정은 불순물을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전기 흐름에 영향을 미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공정에는 높은 순도의 ‘초순수(UPW, Ultra Pure Water)’가 쓰인다. 초순수는 물 분자를 이루는 수소와 산소 이외에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은 물로, 일반적인 물속의 이온(Ion), 미립자(Particle), 염소(Chlorine), 이산화규소(Silica) 등이 제거된 고도로 정제된 물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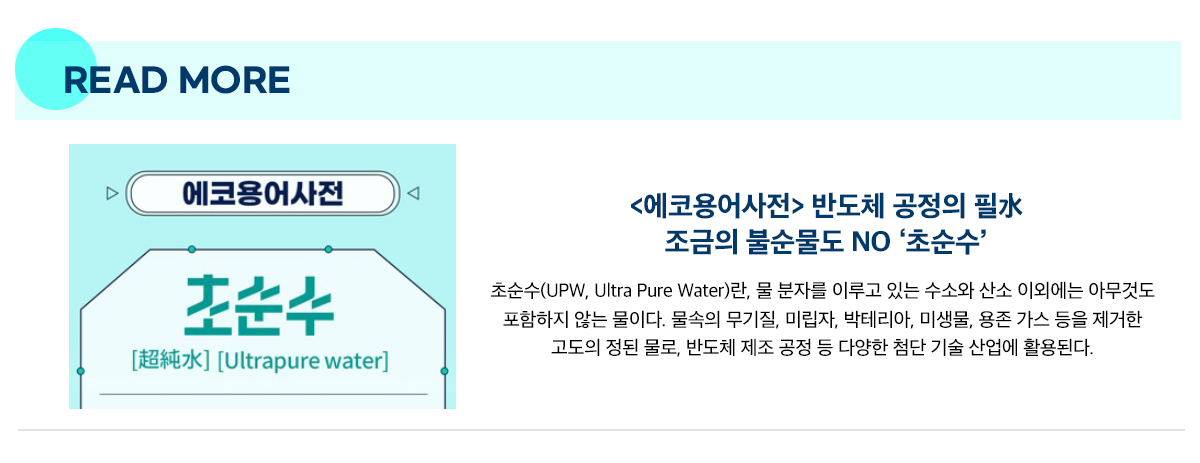
이러한 초순수를 고압으로 쏘아 실리콘 덩어리를 잘라내어 원판 모양의 ‘웨이퍼’로 만들고, 그 위에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약품을 초순수로 세척하는 식이다.
때문에 이런 초순수는 다양한 산업에서 두루 이용되지만, 반도체 산업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다.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전체 공업용수 중에서도 초순수의 비율은 약 50% 정도다. 여기서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양의 물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각종 화학물질로 오염된다는 데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폐수를 처리하는 것, 이른바 ‘반도체 수처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주목받는 ‘반도체 수처리’ 산업
반도체 수처리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폐수 정화 기술’이다.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에는 총유기탄소(TOC, Total Organic Carbon, 수중 유기물 구성 탄소의 총량),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 강염기성 유기화학물질), 이산화규소(SiO₂), 요소(Urea) 등 주요 오염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런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맞춤형 기술이 필요하므로, 철저한 연구와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현대 화학 기술을 동원하면 각각의 성분에 맞는 정화법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TMAH는 고도산화공정(AOP, Advanced Oxidation Process)을 거치면 폼알데하이드(HCOH)와 암모니아(NH₃)로 분해된다. 두 가지 물질 모두 산업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중요 자원이다. 요소는 가정용 고성능 정수기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역삼투막법(RO, Reverse Osmosis)을 이용해 50% 정도 제거가 가능하다. 50%면 정화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필요한 수준까지 정화할 수 있다.
물의 순환만 생각하면 모든 폐수를 다시금 초순수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나 효율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서 초순수까진 아니어도 환경 기준에 맞는 맑은 물로 만들어 배출하거나, 적절한 수준의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수처리 전문기업들의 활약이 필요해진다. 이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이 원하는 초순수를 생산해 납품하고, 공장 내에 수처리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필요하면 폐수를 수거해 처리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베리파이드 마켓 리서치(Verified Market Research)에 따르면 반도체 수처리 시장 규모는 2023년에 5,246억 달러(약 760조원)에서, 2031년에는 7,902억 달러(약 1,150조원) 규모로 확대되며 연평균 6.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처리 분야 국내 기업 활약도 기대
국내에서도 사용된 물을 더 효율적으로 재이용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물 재이용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하루 12만 톤(t)의 재활용 용수를 반도체 사업장에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 분야 기업들도 물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관련 기술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하·폐수 재활용 기술 중 하나인 CSRO(Circle-Sequence Reverse Osmosis, 순차적 순환공정역삼투막)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기술은 오염수를 정방향, 역방향으로 순차적 전환하는 기술로, 한 번의 공정으로 폐수가 삼투막 필터를 여러 차례 왕복하도록 해 수질 정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일반적인 역삼투막 공정의 하·폐수 재이용 회수율은 보통 75% 수준으로 설계되는데, SK에코플랜트는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CSRO 기술 파일럿 실증을 진행한 결과 최대 회수율 97%를 달성했다. 이러한 기술의 우수성과 자원절약 효율성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녹색기술 인증을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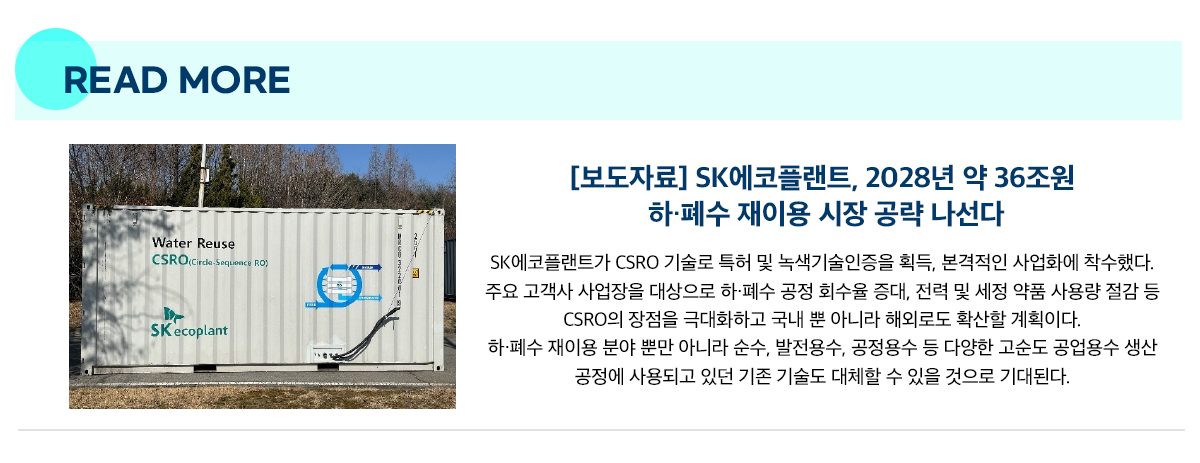
앞으로 물 부족 문제는 점차 심화할 것으로 여겨진다. 2020년 발표한 환경부의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 국내 하루 공업용수 부족분은 하루 약 133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AI 시대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지금, 반도체 수처리 기술 확보는 이미 국가적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다.
전승민 기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과학 저널리즘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동아일보 과학팀장, 과학동아 기자, 동아사이언스 수석기자를 역임했다. 현재 과학 및 기술, 의학 분야 저술가로서 다수의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