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반도체 경쟁력, ‘전구체’ 시장을 잡아라
반도체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최근 SK에코플랜트가 반도체 소재 기업들을 자회사로 신규 편입하며 반도체 종합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중 반도체 생산에 핵심 소재라 불리는 전구체 기술을 보유한 SK트리켐도 포함됐는데, 전구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앞으로 SK에코플랜트와 어떠한 시너지를 낼 것인지 그 전망을 들여다본다.


전승민
과학기술분야 전문 저술가
반도체는 이미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재료’ 중 하나다. 주위를 둘러보면 컴퓨터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에도 모두 반도체로 구현된 첨단 제어기술이 들어간다. 누구나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자동차에도,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팔에도, 거리를 누비는 배달 로봇도 반도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물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해 통합 운영하는 세상이다. 더구나 챗GPT(ChatGPT)로 대변되는 고성능 AI 서비스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컴퓨터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소재가 있는데, ‘전구체’가 그 주인공이다.
.
‘전구체’,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전구체란 단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전구체는 한자로 ‘前驅體’라고 적는데, 한 자씩 한글로 풀이해 보면 ‘이전에(前, 앞 전)’, ‘나아가게 하는(驅, 몰 구)’, ‘물질(體, 몸 체)’ 정도로 적을 수 있을 것 같다. 영어로는 프리커서(precursor). pre-는 한자어 전(前)과 비슷한 의미이며, 커서(Cursor)는 흔히 ‘마우스 커서’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커서와 같은 단어로, 라틴어 원문 뜻은 ‘달음박질하는 사람’ 또는 ‘마차경기자’다. 구(驅)와 거의 같은 의미다. 즉 전구체란 단어는 주로 ‘어떠한 화학적 반응을 위한 준비물질, 혹은 그 재료’를 의미한다.
그런데 산업이나 연구 분야에 따라서는 그 의미에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회로를 만들 때 덮어 붙이는(증착) 얇은 막, 이른바 ‘박막(薄膜, Thin Film)의 핵심 소재’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반도체 회로가 점점 더 정밀해지면서 이러한 전구체의 선택이나 그 품질이 반도체 자체의 성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에 해당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부쩍 전구체란 단어가 핫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도체 칩은 고순도의 실리콘을 원판 모양으로 얇게 잘라 만든 웨이퍼(Wafer)의 표면을 깎아내고 필요한 물질을 붙이며 전기회로를 그리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이 전기회로를 그리는 것은 사람의 손은 물론 기계장치로도 거의 불가능할 만큼 미세한 작업으로, 주로 빛과 화학 반응을 이용해 극도로 얇게 녹여내고 다시 그 위에 박막을 증착해가며 만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물질 간 전기적 간섭을 막고 회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층마다 얇은 박막을 형성해 분리해주는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박막을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그리고 원하는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형성하느냐는 고성능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박막의 핵심소재인 전구체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할까. 일단 전구체는 박막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준비 물질이므로 ‘가공 특성’이 중요하다. 기체 형태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적절한 휘발성(Volatility)을 가져야 하며, 웨이퍼 표면에 도달하기 전까지 분해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열적 안정성(Thermal Stability) 또한 필수적이다. 이후 웨이퍼 표면에 도달한 뒤에는 높은 반응성(Reactivity)을 통해 원하는 화학 반응을 효과적으로 일으켜야 한다. 여기에 더해, 공정 중 불순물이나 유기물의 잔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순도(High Purity)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잡한 반도체 표면에도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도록 우수한 단차 피복성(Step Coverage, 박막이 얼마나 균일하게 입혀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을 갖추는 것도 핵심 요건 중 하나다.

최근 박막 공정에는 화학기상증착(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이나 원자층증착(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방식이 많이 쓰인다. CVD 공정은 전구체를 기화시켜 열에너지나 플라스마(Plasma, 이온화된 기체로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물질의 상태 중 하나)로 화학 반응을 유도해 반도체 표면에 박막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ALD 공정은 이보다 한층 더 정교한 기술로, 전구체와 전구체의 반응을 돕는 다른 화학물질을 번갈아 가며 원자 하나 정도의 두께인 0.1~0.2㎚(나노미터, 1㎚은 10억 분의 1m) 박막을 한 겹씩 쌓아 올리는 방법이다. 특히 최근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이 수㎚ 이하까지 내려가고 있고, 반도체 회로 구성 자체도 대단히 복잡해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패턴들이 쌓여 사실상 ‘입체적인 구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더욱 얇고 균일한 박막을 형성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최근엔 ALD 공정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
매년 높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전구체 시장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전구체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전구체 시장은 지난해 25억 달러(약 3조 5,000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12.8%씩 성장해 2030년에는 53억 달러(약 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tratistics MRC, 2024) 그리고 이 성장은 이른바 ‘하이케이(High-k, 고유전율)’ 전구체의 수요가 이끌 것으로 보인다. 하이케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높은 전기흐름을 가졌다는 의미로, 이러한 하이케이 전구체를 이용하면 더 고성능의 전기회로를 만들 수 있어 반도체 미세화에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내 산업계도 하이케이 전구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전구체 생산기업인 ‘SK트리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SK트리켐의 제품군은 크게 Zr-프리커서(지르코늄계 전구체), Si-프리커서(실리콘계 전구체), Ti-프리커서(타이타늄계 전구체), Hf-프리커서(하프늄계 전구체)로 구분하는데, 이 중 실리콘계를 제외하면 모두 하이케이 계열의 전구체다. 각 전구체는 증착 과정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각각 산화지르코늄(ZrO₂), 산화실리콘(SiO₂), 산화타이타늄(TiO₂) 산화하프늄(HfO₂) 형태로 바뀌어 반도체 표면에 박막으로 씌워진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Zr-프리커서는 ‘D램(컴퓨터의 주기억장치)’ 생산을 위한 ALD 공정에, Si-프리커서는 D램과 ‘3D-NAND 플래쉬 메모리(SSD 등 컴퓨터 데이터 저장장치 제조용 반도체)’ 제조 과정의 CVD/ALD 공정에 두루 쓰인다. Ti-프리커서와 Hf-프리커서도 D램용 ALD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엔 성능이 뛰어나고 공정 안정성도 높은 Hf-프리커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SK트리켐은 국내 전구체 기업 중 독보적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
전구체 기술 품은 반도체 종합 서비스 기업 SK에코플랜트
더욱이 SK트리켐은 최근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을 추진 중에 있다. SK에코플랜트는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을 포함한 반도체 제조 인프라는 물론, 반도체용 가스 공급, 반도체 메모리 생산 등 종합적인 반도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SK트리켐의 합류를 통해 더욱 전방위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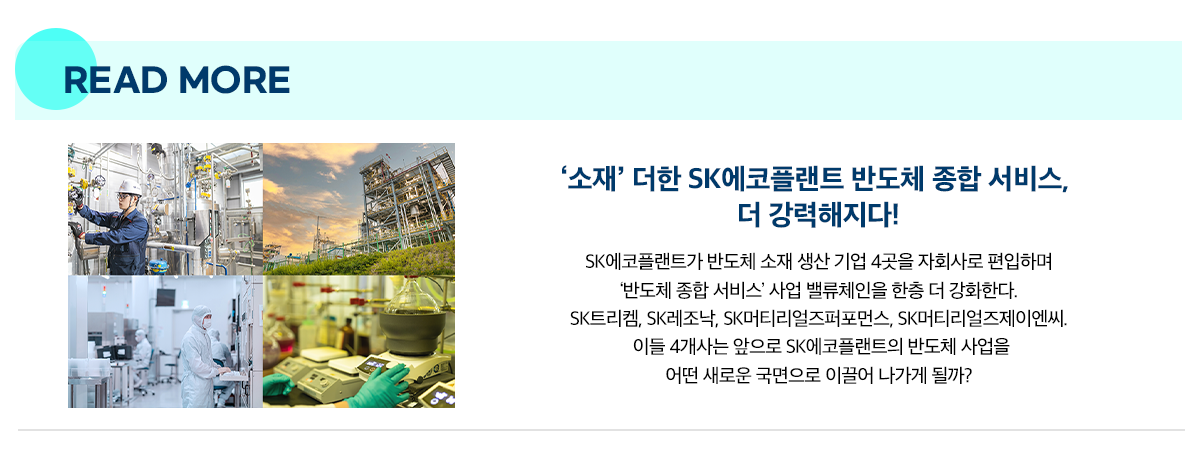
흔히들 다가오는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AI, 로봇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계열의 첨단 기술 산업을 꼽고 있다. 그 뿌리가 되는 반도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SK트리캠을 품은 SK에코플랜트가 ‘반도체 종합 서비스’를 통해 업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전승민 기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과학 저널리즘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동아일보 과학팀장, 과학동아 기자, 동아사이언스 수석기자를 역임했다. 현재 과학기술분야 전문 저술가로서 다수의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연관 콘텐츠
AI 시대 반도체 경쟁력, ‘전구체’ 시장을 잡아라


전승민
과학기술분야 전문 저술가
반도체는 이미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재료’ 중 하나다. 주위를 둘러보면 컴퓨터나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에도 모두 반도체로 구현된 첨단 제어기술이 들어간다. 누구나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도, 자동차에도,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팔에도, 거리를 누비는 배달 로봇도 반도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물건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통해 통합 운영하는 세상이다. 더구나 챗GPT(ChatGPT)로 대변되는 고성능 AI 서비스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컴퓨터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소재가 있는데, ‘전구체’가 그 주인공이다.
.
‘전구체’,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전구체란 단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전구체는 한자로 ‘前驅體’라고 적는데, 한 자씩 한글로 풀이해 보면 ‘이전에(前, 앞 전)’, ‘나아가게 하는(驅, 몰 구)’, ‘물질(體, 몸 체)’ 정도로 적을 수 있을 것 같다. 영어로는 프리커서(precursor). pre-는 한자어 전(前)과 비슷한 의미이며, 커서(Cursor)는 흔히 ‘마우스 커서’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커서와 같은 단어로, 라틴어 원문 뜻은 ‘달음박질하는 사람’ 또는 ‘마차경기자’다. 구(驅)와 거의 같은 의미다. 즉 전구체란 단어는 주로 ‘어떠한 화학적 반응을 위한 준비물질, 혹은 그 재료’를 의미한다.
그런데 산업이나 연구 분야에 따라서는 그 의미에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반도체 회로를 만들 때 덮어 붙이는(증착) 얇은 막, 이른바 ‘박막(薄膜, Thin Film)의 핵심 소재’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반도체 회로가 점점 더 정밀해지면서 이러한 전구체의 선택이나 그 품질이 반도체 자체의 성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이에 해당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부쩍 전구체란 단어가 핫해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도체 칩은 고순도의 실리콘을 원판 모양으로 얇게 잘라 만든 웨이퍼(Wafer)의 표면을 깎아내고 필요한 물질을 붙이며 전기회로를 그리는 방식으로 생산된다. 이 전기회로를 그리는 것은 사람의 손은 물론 기계장치로도 거의 불가능할 만큼 미세한 작업으로, 주로 빛과 화학 반응을 이용해 극도로 얇게 녹여내고 다시 그 위에 박막을 증착해가며 만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물질 간 전기적 간섭을 막고 회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층마다 얇은 박막을 형성해 분리해주는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박막을 얼마나 얇고 균일하게, 그리고 원하는 전기적 특성을 갖도록 형성하느냐는 고성능 반도체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박막의 핵심소재인 전구체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할까. 일단 전구체는 박막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준비 물질이므로 ‘가공 특성’이 중요하다. 기체 형태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하므로 적절한 휘발성(Volatility)을 가져야 하며, 웨이퍼 표면에 도달하기 전까지 분해되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열적 안정성(Thermal Stability) 또한 필수적이다. 이후 웨이퍼 표면에 도달한 뒤에는 높은 반응성(Reactivity)을 통해 원하는 화학 반응을 효과적으로 일으켜야 한다. 여기에 더해, 공정 중 불순물이나 유기물의 잔류를 최소화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순도(High Purity)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잡한 반도체 표면에도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도록 우수한 단차 피복성(Step Coverage, 박막이 얼마나 균일하게 입혀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을 갖추는 것도 핵심 요건 중 하나다.

최근 박막 공정에는 화학기상증착(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이나 원자층증착(ALD, Atomic Layer Deposition) 방식이 많이 쓰인다. CVD 공정은 전구체를 기화시켜 열에너지나 플라스마(Plasma, 이온화된 기체로 고체, 액체, 기체와 같은 물질의 상태 중 하나)로 화학 반응을 유도해 반도체 표면에 박막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ALD 공정은 이보다 한층 더 정교한 기술로, 전구체와 전구체의 반응을 돕는 다른 화학물질을 번갈아 가며 원자 하나 정도의 두께인 0.1~0.2㎚(나노미터, 1㎚은 10억 분의 1m) 박막을 한 겹씩 쌓아 올리는 방법이다. 특히 최근엔 반도체 회로의 선폭이 수㎚ 이하까지 내려가고 있고, 반도체 회로 구성 자체도 대단히 복잡해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패턴들이 쌓여 사실상 ‘입체적인 구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더욱 얇고 균일한 박막을 형성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 최근엔 ALD 공정이 한층 주목받고 있다.
.
매년 높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전구체 시장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전구체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전구체 시장은 지난해 25억 달러(약 3조 5,000억 원) 규모에서 연평균 12.8%씩 성장해 2030년에는 53억 달러(약 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tratistics MRC, 2024) 그리고 이 성장은 이른바 ‘하이케이(High-k, 고유전율)’ 전구체의 수요가 이끌 것으로 보인다. 하이케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높은 전기흐름을 가졌다는 의미로, 이러한 하이케이 전구체를 이용하면 더 고성능의 전기회로를 만들 수 있어 반도체 미세화에 필수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국내 산업계도 하이케이 전구체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전구체 생산기업인 ‘SK트리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SK트리켐의 제품군은 크게 Zr-프리커서(지르코늄계 전구체), Si-프리커서(실리콘계 전구체), Ti-프리커서(타이타늄계 전구체), Hf-프리커서(하프늄계 전구체)로 구분하는데, 이 중 실리콘계를 제외하면 모두 하이케이 계열의 전구체다. 각 전구체는 증착 과정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각각 산화지르코늄(ZrO₂), 산화실리콘(SiO₂), 산화타이타늄(TiO₂) 산화하프늄(HfO₂) 형태로 바뀌어 반도체 표면에 박막으로 씌워진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Zr-프리커서는 ‘D램(컴퓨터의 주기억장치)’ 생산을 위한 ALD 공정에, Si-프리커서는 D램과 ‘3D-NAND 플래쉬 메모리(SSD 등 컴퓨터 데이터 저장장치 제조용 반도체)’ 제조 과정의 CVD/ALD 공정에 두루 쓰인다. Ti-프리커서와 Hf-프리커서도 D램용 ALD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엔 성능이 뛰어나고 공정 안정성도 높은 Hf-프리커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SK트리켐은 국내 전구체 기업 중 독보적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
전구체 기술 품은 반도체 종합 서비스 기업 SK에코플랜트
더욱이 SK트리켐은 최근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로 편입을 추진 중에 있다. SK에코플랜트는 팹(FAB, 반도체 제조공장)을 포함한 반도체 제조 인프라는 물론, 반도체용 가스 공급, 반도체 메모리 생산 등 종합적인 반도체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번 SK트리켐의 합류를 통해 더욱 전방위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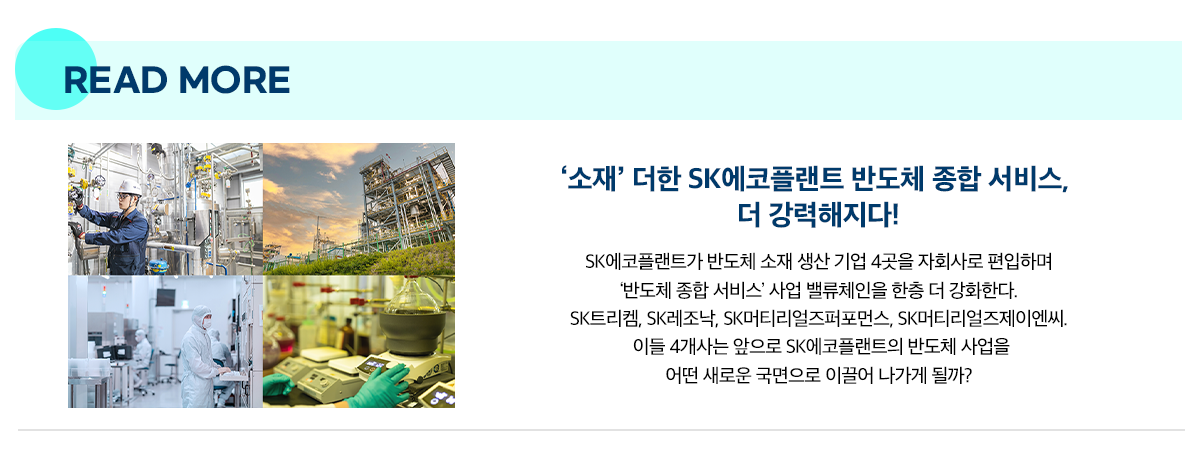
흔히들 다가오는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AI, 로봇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계열의 첨단 기술 산업을 꼽고 있다. 그 뿌리가 되는 반도체의 중요성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SK트리캠을 품은 SK에코플랜트가 ‘반도체 종합 서비스’를 통해 업계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전승민 기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과학 저널리즘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동아일보 과학팀장, 과학동아 기자, 동아사이언스 수석기자를 역임했다. 현재 과학기술분야 전문 저술가로서 다수의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